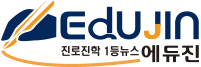| ||
얼마 전 H에게서 문자가 왔다.
 | ||
| ▲ 강원사대부고 김현진 교사 | ||
“선생님, 아주 오래 된 고민이 있는데 얘기하고 싶어요.”
“오케이, 언제 볼까?”
“목욜 어떠세요?”
“좋아.”
약속한 목요일이 되자 H가 찾아왔다. 학교 밖 카페로 가서 얘기를 나눴다. 중학생 때부터 은근한 따돌림과 사이버 폭력에 시달린 학생이다.
그런데 H를 괴롭힌 일종의 가해자가 10여 명 안팎인데 그 중 2명과 우리 학교에 배정받았고, 그 중 한 명과 올해 같은 반이라고 한다.
10여 명의 아이들은 성적도 상위권이어서 그 중 몇 명은 특목고, 자사고 등등에 진학했다고 한다. 그래서 괴롭힘이 겉으로 절대 드러나지 않았다 한다. 무려 중학교 3년 동안이나 아무도 몰랐단다.
“그럼, 부모님은?”
“모르세요.”
“어떻게?”
H는 딸 셋 중 둘째라고 했다. H의 언니는 고3이고 동생은 운동을 하는데, 동생이 하는 운동이 워낙 돈이 많이드는지라 물질적 지원은 없는 상태였다. 고3 언니는 공부를 잘 안 해서 부모님은 성적이 상위권인 H에게 일종의 심리적 기대를 많이 하신다고 했다.
그런 부모님께 자신이 당한 일을 말하면 걱정하실까봐 3년 여간 당한 따돌림을 얘기하지 못했다 한다. 스트레스로 아토피 상처에서 진물이 나와 교복이 들러붙을 때까지 말이다.
그런데 얘기하면서 계속 부모님이 걱정 하실까봐, 언니보다 공부 잘하면 혹시라도 부모님이 속상해 하실까봐, 심지어 따돌리는 친구들에게 놀림과 따돌림이 싫다고 하면 그 친구들이 같이 안 놀까봐 항상 웃기만 했다고 하는데, 숨이 턱 막혀온다.
“H, 네가 잘못 한 게 무엇인 거 같아?”
“... 싫은데 싫다고 말 못한 거요.”
“그래, 답은 네가 다 알고 있네. 샘이 어떻게 해주길 바라?”
“그냥, 어딘가에 다 털고 그 기억들을 다 버리려고요.”
“샘이 들어줬으니 그 기억들은 버릴 거야?”
“그러려고 샘 만나자 한 거예요.”
어떤 일을 하고 싶냐 물으니,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하고 싶단다. 그 중 한 가지가 법학인데, 자신처럼 비슷한 일을 당한 사람을 위해 일하고 싶단다. H는 자기가 당했던 일을 이유 없는 ‘혐오’라고 정리했다. ‘혐오’가 맞다. 10여 명의 공부 잘하고 반장을 도맡아 하던 애들이 H에게 한 일은 혐오였다.
 | ||
| ▲ 강릉영동대학교 입학처 http://goo.gl/nHJN6o | ||
며칠 전, 한 번 남은 기회를 버리고 향후 10년의 계획을 수정할 거라고 친구에게 얘기한 적이 있다. 그 친구와 함께 준비했던 일인데, 친구는 그 궤도로 들어갔다. 내가 이제 원래 나 하던 일을 할 거라 하니,
“한 번 더 도전해 봐.”
“싫다, 그걸 어떻게 또 하냐?”
“에이, 애들한텐 도전하라 할 거면서.”
걘, 점쟁이인가?
어느 순간, 나는 H에게 나의 일을 말해주며 ‘그 기억을 버리고, 샘과 같이 도전해 보자’고 말하고 있었다. 그래, 내가 실천하지 않고 학생에게 실천해 보자고 하는 것은 역시나 불가능하구나. ‘내가 해봐서 아는 데’ 가 아니라 '같이 하자'고 말하니, 한결 마음이 편하다. 헤어지면서 H에게 말했다.
“샘이, 너 땜시 계획 수정할지 생각해 볼 거야. 넌 어떡할 거야?”
“샘이 하신다는데, 저도 해야죠.”
그... 그래?
이거 큰일이다. 진짜 H땜에 계획 수정하게 생겼다...;;
얘기하며 몇 번을 울던, 여태껏 자기가 ‘착한 척’을 해서 그런 일을 당했던 것 같다고 하던 H. 결론은 엉뚱하지만, 아이들이 ‘싫다’, ‘좋다’를 분명히 말할 줄 아는 '발칙한' 학생들로 성장할 수 있도록 또 무언가를 깨작깨작 해야겠다.
*기사 원문: http://www.eduj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940
 | ||
| http://goo.gl/bdBmXf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