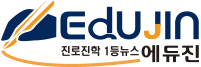| ||
진로교육은 진학교육이 아니다
우연히 페이스북 타임라인을 보다가 전국기능경기대회를 앞둔 전문계고 학생들이 더운 여름을 견디며 ‘꿈과 열정’을 갖고 연습 중이라는 소식을 보았다. 강원도 선수단이 종합 6위를 목표로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는 미담성 기사였다.
인권을 알게 되면 피곤하고 고급지게 영생할 수 있다는 말처럼, 나도 그 길에 들어선 듯하다. 어떤 현상을 봐도 그 기준을 ‘인권’으로 삼는 나 자신을 보면 참 놀랍기도, 피곤하기도 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게 참 매력적이라 헤어나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다.
 | ||
| ▲ 강원사대부고 김현진 교사 | ||
얼마 전에 실시한 학교인권실태조사 면접을 할 때, 모 특성화고에 가서 학생과 보호자들을 면접할 기회가 있었다.
내가 예전에 알고 있던 그 학교의 모습(어두컴컴하고, 덩치가 산만한 남학생들이 1,300여 명이 다니는 학교)을 떠올리며 방문했는데, 만난 학생들은 생각보단 밝은 표정이었다.
참가 학생들은 학교 전공 7개중, 가장 상위 성적인 전공과의 학생들이었으며 그 과는 일종의 특례가 적용되는 과였다. 특례의 내용은 그 과를 졸업하면 하사관으로 군 복무를 할 수 있다는 것인데, 2016학년도에 그 제도가 처음 실시되었다고 한다. 실제로 매우 높은 성적을 가진 지원자가 몰렸고, 100명 이상이 불합격했다고 전해 들었다.
현실적으로 말하자면, 이 친구들은 일반고에 지원해도 별 문제 없는 학생들이다. 그런데 면접에 참여한 학생 모두에게 왜 이 학교에 진학했냐고 물으니, 대부분 취업난을 고려해서 지원했다고 답했다. 부모님과 의논 끝에 대학에 가서 이도저도 아닌 상태로 공부를 하느니, 취업을 빨리 하는 게 더 낫다고 판단해서 지원했다는 것이다. 그런데 ‘학교 밖에서 A고를 다닌다고 하면 뭐라고 하느냐?’란 질문에 학생 한 명이 이렇게 말했다.
“음...뭐라고 특별히 말을 하진 않는데요, 그 분위기라는 게 있잖아요?”
“어떤 의미예요?”
“음... 공고 다닌다고 하면 바라보는 그 시선이 있어요.”
“네?”
“제가 다니는 교회에 여기 합격했다고 했더니, 저를 되게 안쓰럽게 바라보더라고요.”
그러자 다른 친구가 “그렇지만 취직도 어려운데 참 대견하다고 칭찬하는 어른도 있어요.”
이게 우리 사회가 특성화고를 바라보는 이중적인 시선이라는 생각이 든다. 기능경기대회에(난 이 대회도 대체 언제 적 유물인지 잘 모르겠다) 참가하는 건, 대회니까 중요하다. 대회에 참가하면 좋은 성적을 내야 하는 사회니까 말이다. 하지만 이 친구들이 사회에 나가면 ‘공고에 다닌다고 하면 바라보는 시선’을 감내해야 하는 것이다.
3학년 1학기가 끝나면 어쨌건 실습을 나가야 하는데, 이것도 좋은 과가 먼저 나가고 그 다음 같은 과에서 성적순으로 나간다. 그나마 자기 전공을 살릴 수 있는 실습을 하게 되면 다행이지만 지난번, 인터넷 비즈니스 전공생이 대형 패밀리 레스토랑 주방에 취업했다가 그곳의 폭력적 분위기와 구타, 그리고 강도 높은 노동을 견디지 못한 끝에 자살한 사건(거의 묻혀서 아는 사람이 별로 없다)을 보면 비단 전공대로 실습을 나간다고 볼 수도 없다. 그리고 그렇게 죽은 학생에게 “그렇게 의지가 약해서 밥은 먹고 살겠니?”라는 말만 하지 않아도 꽤 괜찮은 사회이다.
왜 인터넷 비즈니스 전공생은 패밀리 레스토랑 주방에 실습을 하러 갔을까? 그 죽일 놈의 ‘취업률’ 때문이다. 교육부가 교육청을 평가할 때 아마도 특성화고 취업률도 반영을 하는 것 같다. 학생 개인이 자기 전공을 살리는 실습을 나가는 것에는 학교도, 특성화고 교사도, 교육청도, 가장 큰 문제의 주범인 교육부도 관심이 없다. 취업률만 확보하면 그 이후엔 그 학생이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관심이 없는 사회와 학교……. 진로교육이 어느 순간 ‘진학교육’과 같은 의미로 사용되는 것에 많은 우려가 생긴다.
‘안드로메다’로 날아간 진로교육
진로를 교육할 수 있는지도 잘 모르겠지만, 올해 진로교육부에서 근무를 해보니, 교육부가 진로교육에 얼마나 우스운 짓거리를 하고 있는지가 보여서 기가 막혀 한 적이 여러 번이다.
일반계고와 특성화고를 제외한, 나머지 고교 시스템이 생기고 나서 지방의 고등학교 학생이 ‘In Seoul’ 대학으로 진학한다는 것은 하늘의 별 따기이다. 그런데도 확률 없는 게임에 무한대의 돈과 시간을 쏟아 붓는다.
학교에서 벌어지는 방향성이 뒤집혀 있는 여러 가지 일 중에, 나는 가장 큰 것이 진로교육이라고 생각한다. 그야말로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어떻게 살 것인가?’라는 질문은 던지지도 않고, ‘너 무슨 일 할래?’를 묻고 답을 구하는 사회. 방향을 정해야 목표물이 생기는 것 아닌가? 어떻게 살지를 고민하는 청소년이 ‘희귀한 존재’가 되는 학교. 이 간극을 학교에서 어떻게 채워야 할까?
다시, 제자리로 와서, A고의 보호자들을 면접할 때 들은 어느 보호자의 가슴 아픈 건의사항이 떠오른다. 애들이 실습 나가기 전에 위험에 처했을 때 자기를 지킬 수 있는 방법을 학교에서 적극적으로 알려줬으면 좋겠다는 보호자의 얘기다.
“노동인권교육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했더니 “네, 그게 그거 맞죠? 실습 나가서 죽었다는 애들 기사 보면 남의 일 같지가 않아서요.”
기능경기대회에 나가는 특성화고 학생들에게 ‘꿈과 열정’만 얘기하지 않고, 그들이 나가게 될 노동현장의 현실과 자신의 존엄성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는 학교와 교육청은 언제쯤 만들어질까? 마이스터고를 졸업해 취업한 친구들은 정말 대학을 나오지 않았어도 대학을 졸업한 사람과 같은 대우를 받고 있는지 궁금하다. 마이스터고를 밀어붙인 그 권력자가 마이스터의 의미는 알고 그랬는지는 의심이 되지만.
기능경기대회 금메달을 받은 친구는 사회에서도 금메달 만큼의 대우를 받을까? 모든 교과를 통해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학생이 스스로 자신에게 던질 수 있게 하는 교육은 안드로메다에 있는 것일까?
*에듀진 기사 원문: http://www.eduj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098
 | ||
| http://goo.gl/bdBmXf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