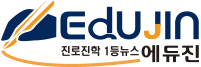강원사대부고 김현진 샘의 교단일기
 | ||
올해 첫 인권감수성 교육을 하기 위해 90km를 달려 A지역에 도착했다. 원래 2시간 연수로 신청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도착했더니 담당 선생님이 “4시 30분 전에 끝내 주세요”라고 해 적잖이 당황했다. 도착한 게 3시 45분이고, 교육은 50분이 넘어서 시작했기 때문이다.
 | ||
| ▲ 강원사대부고 김현진 교사 | ||
“아, 선생님. 그렇게 하면 얘기를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걱정 마세요. 교육청엔 2시간 했다고 보고할게요. ”더 이상 그날 수업은 얘기하고 싶지 않다. 무거운 찜찜함을 뒤로 하고 둘째를 같이 키우며 4년을 함께했던 예은(가명)이네를 만나러 또 10km를 달렸다.
초등 부부교사인 예은이네는 부부가 딸을 데리고 A지역 학교에서 함께 근무하고 있으며, 그야말로 자신들의 삶과 교육을 학생들과 함께 나누고 있는 분들이다. 또, 결혼 후 7년 만에 어렵게 얻은 딸아이를 데리고 아이가 7살 때 부부가 육아휴직 후 1년 여간 세계를 일주한 참 멋진 부부이기도 하다. 예은 엄마는 마침 내가 그 지역에서 강의를 한다는 걸 알고 먼저 연락을 해주었다.
함께 저녁을 먹은 후 집에 가서 차를 마셨다. 예은이네는 A지역에 온 지 3년째인데, 첫해에는 1인용 관사밖에 없는 학교에서 1인용 관사 2개를 쓰며 한 학기를 지내다가 지금의 전셋집을 겨우 얻었다 한다. 냉장고가 거실에 안 들어가서 냉장고에서 뭘 꺼내오려면 옆집으로 가야했다며 우스갯소리를 했다. 지금 살고 있는 집은 학교에서 15km 정도 떨어진 곳에 있다.
예은이네 집은 전형적인 농촌형 주택인데 이 집도 간신히 구했다고 한다. 1인용 관사 2개를 동시에 써도 세 식구 살림이 감당이 안 되서 결국 어렵게 집을 얻을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거실이 어찌나 넓은지 겨울엔 난방비가 40여만 원이 나오는데도 실내 온도가 15~16도밖에 안 돼 커다란 톱밥 난로를 설치했지만, 여전히 한 겨울엔 너무 추워서 실내에서 내복에 점퍼를 입고 온갖 난방 기구를 쓰며 세 식구가 꽁꽁 싸매고 모여 지낸다며 웃었다.
2000년 9월 비무장지대 근처 군사지역에 첫 발령을 받은 나는, 들어갈 수 있는 관사가 없어서 한 달을 춘천에서 편도 1시간 30분 거리를 다른 선생님의 차를 얻어 타고 통근을 했다. 한 달 여 만에 간신히 학교 앞에 있는 정말 허름한 방 하나를 구했는데, 거기서 1년 반을 자취를 했다.
옷을 걸 수 있는 행거를 놓고 1인용 이불을 깔고 누웠더니 여유 공간이 없을 만큼의 좁은 방이었다. 여름에는 습해서 늘 벌레투성이였고(집은 논 한가운데 있었다), 겨울엔 자고 일어나면 코가 시렸다. 그러다가 1년 반이 지난 후 1인용 관사에 들어갈 기회가 왔는데, 그 관사는 얼마나 추웠던지 난방을 하는지가 의심스러울 정도였다.
강원도 시골에서 근무해본 교사들은 안다. 겨울 방학 때 집에 갔다가 개학날이 되어 관사에 왔을 때, 아니면 방학중에 행정실에서 전화가 올 때 무슨 일이 기다리고 있는지 말이다. 십중팔구 개학날 관사 풍경은 수도가 터져서 바닥에 고여 얼어있고, 행정실 전화는 계량기가 터져 있으니 빨리 들어오라는 내용이다. 이건 정말 겪어 보지 않으면 그 난감함을 헤아릴 수가 없다. 농산어촌 근무를 꺼리는 여러 가지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런 불편이다(물론, 승진을 위해서 가는 경우는 예외이다).
얼마 전, 신안군 성폭행 사건으로 인해 전국의 관사 상태를 전수조사했다고 한다. 역시 ‘뻘짓’이란 생각이 들었다.관사 문제는 지속적으로 제기됐던 문제인데 여전히 ‘교육부스럽게’ 저렇게 어마어마한 일이 터지고 나서야 관사 상태를 조사한다고? 과연 그 전수조사 결과를 보기는 할까 의문이다.
 | ||
| ▲ 수원대학교 입학처 http://goo.gl/OI0ptt | ||
참 유치한 비교이지만 강원도 농촌지역에서 가장 고급 주거지는 군인 아파트이다(가끔 부럽기도 하다, 군인들은 어디에 발령 받아도 집 걱정은 없으니 말이다). 전방 지역의 경우, 최근에 읍 지역에 대규모 군인 아파트 단지를 지어서, 면 지역 학교에 다니는 군자녀 학생들이 읍지역으로 대거 전출을 하고, 면 지역 학교는 학생 수 미달로 고사 직전이다.
강원도의 경우 학생수가 15명이 되면 폐교 권고 공문이 온다고 한다(예은이가 다니는 학교 정원이 딱 15명이다). 이 때 학부모들이 반대하면 폐교까지는 안 하지만, 학부모들이 어떤 성향이냐에 따라 또 지역 분위기에 따라 소위 분위기를 잘못 타면 폐교 수순을 밟게 된다고 한다.
더 우스운 건 폐교 결정을 하면 통합하는 학교, 즉 흡수통합의 주체가 되는 학교에 10억을 주고 지역 교육청에는 2억을 준다고 한다. 시쳇말로 ‘이거 먹고 떨어져’라는 얘기다. 물론, 도서벽지의 특수성과 여러 가지 다른 원인이 있다. 그러나 문제는 폐교 결과가 아니라, 폐교 과정에서 당사자들의 얘기를 충분히 듣지 않거나 혹은 그 학교가 소속된 지역 주민들과의 의사소통 과정이 생략되는 것이다.
‘그럼 학생이 한 명이어도 학교가 있어야 된다는 거냐?’라는 질문엔 아직 내 생각이 정리가 안 되어 있다. 그런데 ‘폐교’ 결과를 끌어내기 위한 접근 방법엔 분명 뭔가 오류가 있다는 것이 떨칠 수 없는 불편함이다. 어쨌건 현실은 강원도엔 교육부 기준을 적용하면 당장 없어질 학교 숫자가 어마어마하다는 것이다.
이미 농촌 마을은 삶의 공간이 아니라 노인들이 도시로 내보낸 자녀를 명절에 보기 위해 기다리거나 여름에 고기 잡으러 가는, 농촌 체험활동을 하러 가는 휴양의 공간이 되었다. 이런 측면에서 학교에서 접근하는 마을 교육은 여러 가지 우려를 안고 있는 게 사실이다. 마을이 ‘이름’만 존재하는 현실에서 어떻게 마을 교육을 학교에서 시작할 것인가? 마을을 만들어야 하나? 그렇다고 하면, 학교에서 마을을 만들 수 있는 것인가? 여러 의문이 꼬리를 물고 생긴다.
과연 지역 사회 자원을 이용한 마을 교육에 실효성이 있을까? 그렇다면 마을과 학교가 상생하고 공교육을 살릴 수 있는 그야말로 금상첨화 정책이다.그러나 공부가 짧은 나로서는 아직 잘 모르겠다.
*기사 원문: http://www.eduj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775
 | ||
| http://goo.gl/bdBmXf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