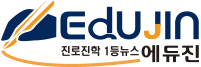- 실수투성이 연주가 끌리는 이유
- ‘잘하는 연주’에는 ‘자신만의 스타일’이 있다

세계적인 음악 콩쿠르를 보면 같은 악기로 같은 음악을 연주함에도 들려오는 소리는 연주자에 따라 천차만별이다. 겉보기엔 똑같아 보여도 제조사나 프랜차이즈에 따라 맛이 오묘하게 다른 콜라나 커피처럼 말이다.
그렇다면 음악 연주에는 완벽한 정답이라는 게 있을까? 연주에서 정답은 ‘각자의 해석에 맞는 고유의 소리’다. 판에 박은 듯한 완벽한 연주 사이에서 누구도 흉내 내지 못하는 해석과 스토리로 음 하나하나에 날개를 달아주는 특별한 연주는 듣는 이들로 하여금 해방감까지 느끼게 해준다. 틀린 음은 있어도 괜찮다. 완벽하지 않아도 된다. 결국 중요한 건 자기만의 스타일이다.
실수투성이 연주가 끌리는 이유
음악은 늘 찰나에 시작해서 순간에 끝난다. 소리를 붙잡거나 고칠 수 없다는 점에서 음악은 인간의 오류로 만들어진다. 음악가에게 실수란 뭘까? 몇 군데 실수를 없애기 위해 음악 전체를 다시 만들 필요가 있을까? 순간의 예술인 음악을 즐길 때마다 드는 의문이다.
여기 아름다운 실수를 일삼은 연주자들이 있다. 먼저 프랑스 피아니스트 알프레드 코르토(Alfred Cortot, 1877~1962)다. 음반을 들어보면 그의 연주는 실수투성이다. 프레데리크 쇼팽(Fryderyk Chopin, 1810~1849)이 피아니스트들의 손가락 연습을 고려해 만든 연습곡이 있다. 요즘은 피아노를 전공하는 초등학생도 눈 감고 치는 작품인데 코르토가 연주하는 이 곡을 듣다보면 기가 막힌다.
12곡이 한 세트인데 코르토는 1번부터 실수를 한다. 단순한 음계를 펼쳐서 치는 이 곡을 코르토는 틀리고 또 틀린다. 이제 괜찮아졌나 싶으면 또 삐끗한다. 고장 난 CD를 들을 때처럼 잠시도 긴장을 늦출 수 없다. 이 음악을 배경음악 삼아 다른 일을 할 수도 없다. 그저 그의 손가락에 매달린 채 온 신경을 집중해야 한다.
다음은 1994년에 태어난 피아니스트 뤼카 드바르그(Lucas Debargue)다. 2015년 러시아에서 열린 차이콥스키 국제 콩쿠르에서 연주하는 동영상을 보자.
드바르그는 유난히 긴 손가락을 괴상하고 불편하게 세워서 거미처럼 연주한다. 음악도 독특해서 템포가 빨랐다 느렸다 오락가락한다. 무엇보다 잡음이 많이 섞여서 쉽게 말해 ‘대회용’ 연주가 아니다. 잘 교육받은 피아니스트가 들으면 이렇게 말할 것이다. “이 연주는 틀렸다.” 드바르그는 이 콩쿠르에서 4위에 올랐다.
피아니스트로서 드바르그의 이력은 독특하다. 피아노는 다른 어떤 악기보다 이른 나이에 시작하는데, 그는 열한 살에 친구가 피아노 치는 걸 듣고 독학으로 시작했다. 하지만 열일곱 살에는 아예 포기하고 슈퍼마켓에서 일했다.
집에는 피아노도 없으며 재즈 클럽에서 아르바이트해 번 돈으로 대회에 나왔다. 피아니스트들 가운데 세계 최고에 오를 자신이 충만한 이들만 나온 차이콥스키 콩쿠르에 드바르그는 용감하게 도전한 것이다. 당연히 오케스트라와 협연도 이번 콩쿠르에서 처음 해보았다.
이 대회의 우승자는 따로 있었지만 콩쿠르 당시 음악을 좀 듣는다는 사람들은 드바르그 얘기만 했다. 그가 연주를 끝내자 청중은 기립 박수를 보냈다. 영국 일간지 [텔레그래프(The Telegraph)]를 비롯해 각종 매체가 그와 인터뷰했다. 인터뷰 기사는 수천 번씩 공유됐다.
모스크바 음악평론가협회의 상을 받았으며, 콩쿠르가 끝나고 4년 뒤에는 소니 클래식스와 계약해 음반을 냈다. 가는 곳마다 청중을 불러 모아 매진시켰음은 물론이다. 심사위원들이 그에게 1등 상을 줄 수 없었던 만큼이나 청중은 그를 잊기 힘들어했다.
코르토 역시 인기 있는 피아니스트로 연주회마다 화제가 됐다. 그렇게 틀렸는데도 말이다. 누구도 흉내 내지 못하는 해석, 꿈꾸는 듯한 소리 때문이다. 무엇보다 ‘틀리면 좀 어때’라는 듯 기존의 질서를 뭉개며 나가는 연주법은 해방감까지 준다. 판에 박은 듯, 살얼음판을 걷듯 완벽한 음악에만 집착하는 연주자가 넘칠 때 코르토의 연주가 더 그리워진다. 결국 중요한 건 자기만의 스타일이다.
‘잘하는 연주’에는 ‘자신만의 스타일’이 있다
어떤 연주가 ‘잘’하는 연주일까? 누가 누구보다 피아노를 더 ‘잘’ 치고 노래를 ‘잘’할까? 많은 이가 음악의 세계를 궁금해 한다. 정확하고 빠르게, 틀리지 않는 것은 많은 연주자의 꿈이다.
하지만 이것이 쉬운 일은 아니다. 모든 사람의 넷째, 다섯째 손가락은 다른 손가락보다 약하다. 새끼손가락을 움직이면 넷째 손가락도 따라 움직이게 마련이다. 이 자연스러운 현상이 피아니스트에게는 큰 고민이다. 한 음씩독립된 소리를 내야 하는데 손가락은 사람 마음을 따르지 않는다.
이 고민을 한 음악가가 슈만이다. 슈만은 음악을 시작하면서 화려하게 연주하는 피아니스트를 꿈꿨다. 문학을 사랑하는 법학도였던 슈만은 니콜로 파가니니 (Niccolo Paganini, 1782~1840)의 귀신같은 연주를 보고 음악가가 될 결심을 굳혔다. 슈만은 말 그대로 귀는 예민했지만 손가락이 따라주지 않자 새로운 방법에 매달렸다. 담배 상자와 줄을 이용한 이상한 장치로 실력을 기르려 한 것이다.
이를 슈만의 장인이 된 프리드리히 비크가 개발했다는 말도 있다. 결국 슈만은 이 기계 때문에 손가락을 다쳐 회복할 수 없었고, 피아니스트로는 당대와 미래 모두에서 이름을 얻지 못했다.
이후 연주자들의 기술은 발전할 만큼 발전했다. 녹음 기술은 음악의 태생을 거슬러 시간을 잡아 되돌린다. 몇 번이고 다시 연주하고 일정 부분만 다시 녹음해 덧붙일 수도 있다. 완벽한 음악이 가능해졌고, 악보에서 한 치도 벗어나지 않는 컴퓨터 같은 연주도 흔하다.
이제 마지막 질문을 할 차례다. ‘잘’하는 연주를 들으면 좋은가? 완벽한 연주는 몇 번이고 다시 듣게 될까? 테너 루치아노 파바로티(Luciano Pavarotti, 1935~2007)의 노래를 들으면 답이 떠오른다. 그의 노래가 좋은 건 목소리가 크고 음이 정확하고 고음을 잘 내서가 아니다. 그런 성악가는 많다. 하지만 어떤 노래가 흘러나와도, 심지어 이 세상 거의 모든 테너가 부른 노래를 들어도 파바로티 목소리는 바로 구별된다.
자기 소리, 자신만의 스타일이 있기 때문이다. 소프라노 마리아 칼라스(Maria Callas, 1923~1977)의 소리는 흠결 없이 곱거나 완벽하지는 않다. 오히려 거친 쇳소리 같기도 하고 지나치게 드라마틱하다.
이 목소리로 마리아는 이탈리아의 오페라 작곡가 도니체티와 벨리니의 작품은 물론 베르디, 푸치니, 바그너의 작품까지 맡아 전천후로 활동했다. 사람들은 이 소리에 따라 울고 웃었다. 칼라스가 해야 들을 수 있는 노래라며 그에게 최고 소프라노 자리를 넘겨줬다.
‘고유의 소리’가 정답이다. 피아니스트 아르투르 슈나벨 (Artur Schnabel, 1882~1951) 또한 1930년대에 베토벤 소나타를 녹음하면서 많이 틀리고 실수가 잦았다. 하지만 독일 고전음악의 전통을 꿰뚫는 그의 연주는 일필휘지로 쓴 글씨처럼 굵고 거침없다.
다시 녹음해 붙인 연주는 따라갈 수 없을 정도로 청중의 감정을 휘몰아치다가 등을 토닥이고, 조용히 자기 내면으로 들어간다. 파바로티, 칼라스의 목소리처럼 이 베토벤 연주를 쭉 들으면 탄식하듯 내뱉게 된다. “아, 이거 슈나벨이구나. 좋다!”
* 자료 제공=메이트북스
- 이 기사는 '나침반 36.5도' [오늘부터 클래식]에 실린 내용의 일부입니다.
경쟁력 있는 나만의 학생부 만드는 비법이 매달 손안에 들어온다면? 학종 인재로 가는 길잡이 나침반 36.5도와 함께라면 가능합니다. 매달 선명해지는 대입로드를 직접 확인하세요!
*에듀진 기사 URL: http://www.eduj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39555
기사 이동 시 본 기사 URL을 반드시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