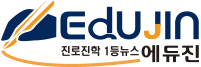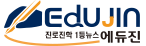- 우리가 알고 있는 중국 역사 요순 등은 모두 동이의 역사
![[사진=클립아트코리아]](https://cdn.edujin.co.kr/news/photo/202504/49422_94974_5927.png)
동이영웅전 제 7호 영웅은 백익을 소개한다.
-------------------------------------------------------------------------------------------------
백익은 여러 글자로 기록이 남겨져 정확한 면모를 찾기가 쉽지가 않은데, 익(益, 嗌, 隘)의 3글자를 혼용하기도 한다.
백익은 백예(伯翳), 백충 장군(百蟲 將軍) 으로도 불렸다.
백예는 진(秦)부락 (감숙성 동부)에서 봉지를 받은 첫 번째 조상이다. 또 그는 ‘소호 금천의 후예이고, 판정(版頂, 화하족)의 후예가 아니다’라고 기록되어 있다.
백익의 익(益) 자에는 “물이 넘쳐 흐른다’, ‘웃사람 중의 웃사람’, ‘피신할 수 있는 험한 요새가 있다’ 등 다양한 뜻이 담겨 있다. 즉 우와 함께 치수 사업을 성공하였고, 울타리(虞)를 만들고 우물을 개발하여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여 커다란 마을이 생기도록 하는 등 많은 공적을 통하여 웃사람 중의 웃사람이 되었고, 우임금으로부터 통치권을 위임받아 왕이 되었다.
이처럼 백익은 우임금을 도와준 사람인데, 『국어』에는 백이(伯夷)가 요임금을 도와주었고, 또 백예(伯翳)가 순임금을 매사에 도와주었던 사람으로 나온다. 우가 죽은 뒤에 백익이 정사를 돌보았지만 재위 3년 만에 계에 의해 축출되고 만다.
고대에 성인 또는 사위가 지위를 물려받던 전통은, 점차 아들이 잇는 것으로 변하게 된다. 다재다능한 백익을 축출하고 계가 우의 왕위를 계승하였지만, 사실 계는 혈통이 분명치 않다. 요임금의 아들이라고도 알려진 계(啟, 胤子朱啟明)를 우왕의 아들 (娶涂山 生啟)로 둔갑시키고 있다. 계에게 양위하고 기산(基山)으로 물러나 살았다고도 하는데 『묵자』에 따르면 백익이 북쪽 지역에 자리를 잡고 구주를 완성시켰다고 한다.
순과 우는 남쪽인 해지 연안(於服澤之陽)에 수도를 정했고,
백익은 산 너머 해지 북쪽(於陰方之中), 옛부터 해(奚, 解)족이 살던 식양(息壤)에 도읍을 정하고 통치를 했다고 한다.
식양이란 “息, xī /시, 쉬, 해, 解, 奚, 何” 등 소리가 유사한 여러 한자로 기록한 것으로 백익 부족이 살던 땅이란 뜻이다.
신성한 동물 해치를 사용해서 법률을 집행하였다는 법관 고요(皐陶)의 아들이 백익이다. 전욱 고양, 또는 고요는 소호 금천씨의 후손이며, 법관으로서 형법과 교칙을 제정하여 법을 시행하였는데, 비로소 이때부터 사회가 화합하고 천하가 크게 다스려졌다고 한다. 우임금은 다음 제위를 고요에게 선양하려 하였는데 고요가 우임금보다 먼저 세상을 떠났다.
고요는 산동성 곡부에서 태어났다 하고 묘는 안휘성 수현(壽縣)에 있다고 하므로 아들인 백익도 산동성 곡부가 고향일 수 있겠다. 또 팽성의 수왕 (壽王, 彭城靖王恭)이 말하기를 “백익이 천자가 되어 우왕을 대신했다 (壽王言 化益為天子代禹)” 라고 하였다. 여기서 수왕이란 서주의 서(언)왕을 뜻하는데 서주의 팽성은 특히 멀어서 고대로부터 중원의 간섭을 받지 않던 독립국이었다. 고요의 아들 백익의 자손들이 영(英)·육(六)·허(許)에 봉해졌다고 한다.
백익은 박식하고 다재다능하였다고 하는데, 『열자』에는 ‘우는 행동으로 보여주었고, 백익은 지식으로 이름이 알려졌다’고 하였다. ‘박, 백, 밝, 부리, 파쿠’ 등은 발음이 유사하고 이 단어들은 모두 현명하다는 뜻을 내포하는 것이다.
『한서 律曆志』에는 백익은 화익(化益)이라 했는데 이는 불, 밝, 불리지, 부리, 부여 등의 불과 관련이 있기 때문일 것이다. 화익은 화인(化人)이라고도 하는데, 고대 사회에서 ‘불’이 지니는 의미를 생각해보면 광명, 혜택뿐만 아니라, 정의, 징벌 등으로 짐작된다.
이러한 표현은 우리 민족 고유의 일월성신 및 삼신 숭배사상, 도교, 불교 등과 밀접하므로, 정의로운 부도가 지켜지는 나라 고조선 사회를 백익이 구현하였던 것이 아닐까?
또 『한서』에서는 백익의 실체를 은미하게 측백나무(柏益)와 같은 사람이라고 기록하며 그를 지극히 높이 평가했다. 고문헌에 나오는 백(柏)나무는 측백나무와 잣나무를 의미하는데, 측백나무는 중국 서북부 내몽고부터 광동성 북부까지 광범위하게 자생하는 반면에, 잣나무는 중원에서는 자라지 않는다.
그래서 잣나무는 영어로 Korean Pine이라고 하는데 우리의 고유종이며 고대로부터 우리는 잣을 수정과에 띄워 먹었다. 부도지에서도 5엽서실(五葉瑞實) 잣, 징표를 새긴 칠색보옥 부인(符印), 삼근영초 인삼을 정기적으로 단군이 모여든 족속들에게 나누어주었다고 하므로 잣나무, 측백나무는 단군 임검의 국가를 상징하는 표식으로 보겠다.
한국 성씨 조(趙), 사마(司馬), 배(裴), 강(江), 마(馬)씨 뿐만 아니라, 지형이 높은 산서성에 많이 살던‘높다’는 뜻을 가진 우(禹), 위(衛, 圍, 魏)씨와 이를 훈역한 고(高), 최(崔, 最), 으뜸 원(元), 해 또는 해비씨(奚, 荷, 解, 解批, 解毗氏, 解枇氏)가 있으며 박씨(朴, 博, 樸, 薄), 상고음이 동일한 사씨 또는 사비씨(谢氏, 谢批氏), 비자와 정백(非子, 井伯)씨 등이 모두 백익의 후손(本伯益之後) 이라고 한다. 그런데 ‘해비’는 햇빛의 음이며, 태양족, 빛살무늬토기, 불(火), 삼족오(해) 등과 밀접하다.
백익의 또 다른 이름은 이기(伊耆)이다.
도덕경을 쓴 노자와 동일한 이(李)씨인데, 동음의 여러 글자(伊, 理, 李, 異)로 나타났다. 이들은 감숙성 돈황(敦煌-토하라 역시 불의 땅을 의미한다)을 지나서 산서성에 와서 많이 살았다. 태원에는 진 대부(晉大夫) 기해(祁奚)가 살던 마을이 있다.
원래 기(祁; 礻,阝)자는 “땅 귀신이 사는 마을”이란 뜻인데 이는 발음이 같은 글자들 “耆, 岐, 箕, 秉”로 적기도 했다. 『해씨성원(何氏姓苑)』에는‘기씨가 부풍인(扶風人)이고 백익의 후예’라고 하였다. 서안-함양 서쪽에 부풍현(扶風縣)이 있고, 진수의 『삼국지』에도 부풍이란 이름이 많이 등장하고 왜인 전에는 치부풍(置扶風)이 나온다.
『강희자전』에는 ‘익작짐우(益作朕虞)’라 하였는데 여기서 짐이란 순, 우왕과 같은 반열의 통치자가 되었다는 것을 말한다. 또 “이기(伊耆)는 옛 왕의 호칭(古王者號)”이라 하였는데, 설문해자의 “이: 은성인아형 윤치천하자 (伊; 殷聖人阿衡, 尹治天下者)”란 문구와도 연결된다. 그런데 사기를 비롯한 여러 고전에는 은나라 대신에 상나라 성인으로 바꾸어서 이기를 상나라 재상으로 둔갑시키고 있다.
상나라의 전설적인 재상 이윤을 아형(伊尹名阿衡) 또는 보형(保衡)이라 하는데, 형이 이름이고 아(阿)와 보(保)는 ‘밝다’는 뜻을 지닌 성씨이다. 발해는 ‘보해’로서 ‘밝해’이자 ‘고조선의 바다’이다. ‘밝해’는 현 발해가 아니고 산동성 안쪽에 있어 대륙으로부터 산동을 분리시키는 바다를 일컬었다.
은나라는 수도를 여러 번 옮겼지만 항상 ‘박’이라고 불렀는데 왜 수도명칭으로 ‘밝다’의 ‘박’과 유사한 발음을 사용했을까? 백익은 일처리에 있어서 매사를 좌우에 치우치지 않고 공평하게 처리하였다.
『강희자전』에 ‘바를 정(正)’이란 “백익이 만든 또는 사용하던 법이 올바른 시법(諡法)”이라 했다. 글자 ‘시(諡)’를 분해해보면 ‘백익의 말’ 이란 뜻이다. 시(㿽)는 xi로서 해(奚), 하(何) 등과 동일한 발음이다. 시와 익(諡, 謚)자는 동일한데 ‘시’는 3황 5제때 부터 있었다. 즉 익법(謚法)이란 백익 시대의 율법이고, 시기(謚記)란 그 율법을 기록으로 남겼다는 뜻이다.
『춘추 곡량전』에서는 ‘시자 권선이징악 (諡者,所以勸善而懲惡)’이라 하였듯이 ‘시’가 바로 권선징악이다. 또 『설문해자』는 ‘시’ 글자를 작시(作謚)라고 했는데, 이를 “삼신사상을 믿던, 빛을 숭상하던 사람들 사이에 태고 시대부터 전해오던 말씀”이라고 했다. 이처럼 백익이 만든 법, 즉 우리 동이가 다룬 율법을 시법이라 했다는 것이 확인되는 것이다.
중화보다 이른 시기에 8조법금이 있으므로 정의로운 고조선 사회를 상상해 보자. 고무래 정(丁)이라는 글자를 ‘正’ 글자 대신에 사용하여 일주서 시법해(諡法解)는 ‘술의불극왈정(述義不克曰丁)’이라고 하였는데 여기서 ‘불극’이란 단어에 특별히 눈길이 끌리는 것이다. 조선은 붉은해, 불그내, 불구레, 불그래 등으로 불리었으니 말이다.
상고사 연구에서는 금석문을 가장 가치있는 사료로 다루는데, 백익의 현령비가 함곡관 서쪽에서 발견되었다. 우리는 마땅히 이 백익의 현령비를 찾아서 연구해야 한다. 이는 관련성이 적은 한참 후대의 사람들이 남겨 놓았기 때문에 어느 금석문보다도 사료적 가치가 더욱 높다고 하겠다.
비문에는 백익이 전욱 고양씨의 둘째 아들이고, 성은 이씨(伊氏), 휘가 익(諱益)이며, 자는 퇴개(隤敳)라 했다고 한다. 백익의 성씨가 이씨란 사료는 이 금석문 하나뿐이다. 또 퇴개란 글자가 백익의 또 다른 이름이란 증거이다. 퇴개가 고양씨의 후손이란 기록은 『춘추좌전』, 『통전』, 『설문해자』 등에도 나온다. 순임금은 고양씨의 후손인 이씨의 딸을 정실로 들였었다.
황제가 치우천왕을 얻어서 “천도를 밝혔다” 라고 하였으나 현존하는 인쇄본에는 그 내용이 빠져있다. 동일한 내용이 『통전』과 『관자』 오행에도 실려 있는데, 모두 퇴개가 유능한 보좌관이라고 기록하고 있다. 퇴(隤)자에는 “귀한 사람(貴)이 살던 마을(阝)이란 뜻”이 들어 있으며, 퇴개라는 이름자에는 “산서성 해지 북쪽 하동군에 있던 귀한 사람이 다스리던 마을을 강압적으로 빼앗음” 이라는 뜻이 숨어 있다.
북쪽에 살던 전욱 고양씨의 후손들이 산서성 서쪽 분수(汾水)를 따라 해지 연안에 이르러 번성하여 “단군 왕검”이 나타났으며, 백익이 살해당하자 그 후손은 다시 북쪽으로 피신했다고 볼 수 있다. 해(日, 太陽)를 뜻하는 여러 글자의 해 (Xie, 解, 阿, 何, 解毗, 解批, 蓋, 盖, 契) 성씨가 특히 산서성 평양(平陽)에 많이 살았다.
계가 백익을 쫓아내고 정권을 빼앗은 사건은 중국 신해혁명(1911~1912년) 이후에 양심적인 사학가 고힐강, 나근택 등이 모여 만든 논문집 『고사변』하사삼론(夏史三論)에서 깊이있게 다루었다. 이러한 사료를 종합해 보면, 합법적으로 지도권을 이양받은 다재다능하고 올바른 사람을 죽이고 지도권을 빼앗은 사실을 은폐하려고 수단과 방법을 다하여 조직적으로 옛 기록을 주물렀음을 알 수 있다.
부루 단군의 생전에 이룩한 치수 업적과 인품, 법관 고요의 아들 등을 비교하면, 불 화익, 시법과 올바름, 해비씨, 이기, 퇴개 등 다양한 이름으로 불린 백익과 유사하다. 교차검증으로 파악되는 백익은 정의로운 동양문화의 시작점이었던 부루 단군이 아닐까?
[발췌=우리 고대 역사의 영웅들]
저자 황순종, 나영주
펴낸곳 시민혁명 출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