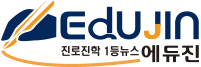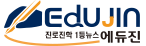진로는 학생만이 아닌 우리 모두의 과제
새로운 시작, 진로교육으로부터
우리나라 교과과정에서 3월은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중요한 달이다. 이미 확정된 계획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진행할까 는 학교의 고민이지만 그 안에서 개인별 성취는 학생에 따라 다 다르게 나타난다. 어떻게 하면 남들보다 앞선 교육을 시킬까 는 매년 반복되는 학부모에게 남겨진 일상의 숙제이다.
올해 대학을 입학한 학생들과 학부모는 한번쯤은 ‘대학 어디 갔어? 라는 말을 들었을 덴데, 아무도 ‘어떤 학과에 들어갔어? 라고 묻지를 않는다.
서열위주의 대학의 시스템에서 수십 년간 노출된 우리의 정서로 하여금 학부모와 학생의 자존심 경쟁의 결과가 그렇게 묻고 있는 것이다. 대학서열이 미래를 보장할까. 어떤 경우에는 미래를 보장할 수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미래와는 아무런 인과관계도 없다.
이렇게 근본적인 차이를 만드는 것은 무엇일까. 최근에 대학은 4년제가 아니라 5년제라는 말까지 들린다. 학생들이 취업을 위해 1년씩 휴학하는 사례가 빈번하기 때문이다. 이름도 잘 알지 못한 낯선 대학에 들어가 대기업에 취업한 사례도 많고, 명문대에 다녔던 학생이 취업을 못해 자살한 뉴스는 더 이상 뉴스거리가 아닐 정도이다.
그래도 스쳐지나가는 한때의 자존심, 한순간의 만족을 위해 유명대를 고집해야할까. 이 모든 것은 장기간을 쳐다보지 못하고 단기경쟁에 내몰린 우리 사회의 문제이기도 하다. 전쟁에서 승리했지만 국가는 망한 결과와 같다. 또한 이것은 먹고 살기 위해 일을 하거나 출세와 명예를 위해 일을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생긴 결과이기도 하다.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어떤 보람을 느끼고 살아갈까에 대해 고민하고 그 고민의 결과가 자연스럽게 그의 인생 스토리에 담기게 되는 것에 대한 것은 왜 외면하고 있을까.
특목고 입시, 대학의 수시, 기업의 입사 등에서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하게 취급하고 있는 그 스토리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 진로교육이 있음에도 순간의 자존심 경쟁을 지속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진로교육은 10대 학생부터 엄마, 아빠 그리고 70대 노인에 이르기까지 우리 모두의 남은 인생을 달라지게 할 수 있다.